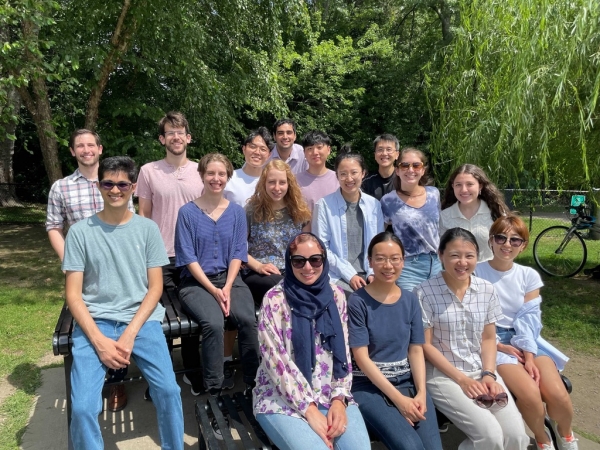| 종이배의 여정 | |
|---|---|
| Date 2023-04-13 01:41:20 |
|

우선, 나에게 기고의 기회를 주신 인천대학교 장성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미국 보스턴에서의 포스닥 기간 같은 랩 동료로 만났던 감사한 인연이 오늘 젊은BT인 란에 다소 부끄럽지만 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 것 같다. 한국말 에세이에 능하지 않은 이과적 마인드를 가진 스테레오 타입 과학자 그리고 교포이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일말의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자 한다.
나는 종이배
나는 종종 나를 종이배에 비유한다. 정사각형 종이 한 장만으로도 몇십 초면 뚝딱 만들어지는 종이배, 모터나 방향키조차도 없어서 몸을 흘러가는 무언가에 맡겨야 하는, 그런 한낱 작은 종이배 말이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종이배에 나를 비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그랬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웠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싶다” 고 당당하게 말 하는 꿈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꿈이 없던 스스로를 자책했던 적이 많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다른 누군가에게 꿈이 있는지를 종종 질문하기도 한다. 서른 중반에 다다른 성인이 되었음에도,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말 할 꿈이 생긴 건 아니다.
마냥 뛰어노는 것이 좋아 체육시간이 제일 신났던 초등학생, 그러다가 공부를 꽤 잘하던 아이로 중학생 시절을 보내며 무난히 성장했다. 기숙생활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약간의 방황을 했지만, 그렇다 할 만한 꿈이 따로 없던 평범한 학생으로 대학입학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 돌이켜보면, 있는 힘껏 놀아보지도, 무언가에 몰두하여 재밌게 보내지 못한 아쉬움들이 남아있는 학창시절이다.
잔잔한 대야에 띄워진 종이배 마냥, 나는 아주 잔잔히, 그리고 또 잔잔히, 누군가가 나를 시냇물로 인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배의 여정
생명공학도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대학입시에 지망했던 영어영문학 전공에서 떨어지며 차선책으로 가게 된 것이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 하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했던 부모님의 충고를 곁들인 나의 선택과, 따르지 않았던 시험운의 산물이었다.
잔잔하게 기다리던 종이배가 드디어 시냇물에 놓인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한다. 과학 중에서도 생물과목이 다소 다른 과목에 비해 재미있었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했던 차선책이 오늘 날 나의 직업, 삶의 일부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냇물로 옮겨진 종이배는 여전히, 그 시냇물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모르고 일단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맡겼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종이배는 열심히 요리조리 옮겨졌다. 꿈이 없던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꿈이 생기지는 않았다.
꿈이 있었던 아이들보다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인간관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진 몰랐지만,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숙제, 과제, 교내 연구프로젝트 등에 최선을 다 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학부생 연구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과학의 신비로움보다, 내가 연구를 계획하고 피펫을 잡고 wet based 실험을 함에 있어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의 계획적이고 차분했던 성격이 나에게 주어진 학부생 연구프로젝트를 꽤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그 시절 담당 교수님께서 연구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던 그날 하루와 풍경들이다. 내가 대학원에 진입한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구가 적성에 맞았지만, 엄청난 무언가에 도취되어 몰두하고 연구하고자 했던 과학자 마인드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만 그런 진취적인 마인드가 아님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랩 선배, 동료, 동기들을 만나며 깨달아서 동질감을 느끼며 뿌듯해 하기도 했다. 취직을 위해 대학원을 온 선배도 있었지만, 연구에 진심인 동료들도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최대한 모나지 않게, 흘러가는 시냇물에 나의 “종이배”가 가라앉지 않게, 그렇게 어울리며 연구과제에 착수하며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취직? 아니면 연구? 라는 물음표를 6년간 달고 살았으며, 일단 박사학위를 받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세포공학, 이름에서 오는 신비로움이 있었다. 대학원을 동물세포공학 연구실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님)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우연히 동 대학에서 정년퇴임하시고 연구원으로 지내시던 조종수 교수님의 co-advising을 받으면서, 고분자 공학을 이용한 약물/백신 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할 기회가 생겼다. 세포공학이라는 이름을 보고 대학원에 왔지만, 나에게 다가온 기회는 고분자 공학이라는 오히려 다른 분야였다. 동물세포공학연구실은 그야말로 다양한 연구주제로 운영이 되는 스펙트럼이 넓은 연구실이고 그 주제는 대장균, 유산균, 효모, 파지디스플레이, 동물세포, 단백질공학, 백신, 고분자, 유전자치료제...등등 이었다.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던 것들과, 토요일마다 열렸던 수년간 랩 세미나 시간의 축적된 지식의 양은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었고, 이후 포스닥 연구기간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영양분이었다. 왜 휴일인 토요일에 랩세미나를 하냐는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잔잔히 스며든 습관 같은 것이면 힘들지 않다는 얘기를 되풀이하며 답하였었던 기억이 난다.
흘러가는 대학원 시간에, 나의 주특기였던 상황에 몸을 맡김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듯 또는 내가 아닌 듯 살았지만, 그 사이사이엔 연구에 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번뇌, 인생에 대한 질문의 시간들로 메워졌었다. 꿈이 무엇 인지에 대한 뚜렷한 답은 얻지 못한 채,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또 다른 방황의 시작이었다. 대학원 끝 시절로부터 수년(약 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때와 비슷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음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보내고 있는나의 동년배 동료들도 그때의 비슷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음을, 이 글을 읽는 나보다 젊은 세대들에 당당하게 얘기해드리고 싶다.
거친 강물이 종이배를 삼킬지라도
포스닥 연구원으로 있는 지금의 직장인 Boston University오게 된 계기도 “시대적 흐름”에 맡긴 선택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의 정해진 몇 가지 진로라는 틀 안에서, “process of elimination”을 통해 선택한 것이니까 말이다. 수년의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flexible한 타임프레임으로 일하던 인간이 타이트한 시간 준수를 해야 하는 회사생활에 자신이 없어 선택한 것이었다.
미국에서의 포스닥 연구원으로서의 삶은 녹녹치 않았다. 요동치게 흘러가는 강물줄기에 몸을 가누느라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 또한 견딜 만한 버거움이었다.
포스닥 연구원을 시작하면서 전공분야를 고분자공학에서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로 바꾸게 되었다. 대학원 진입 시세포공학이라는 이름에서 느꼈던 신비로움처럼, 합성생물학이라는 신흥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 세포공학과 합성생물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때문에 합성생물학이라는 용어로 확장해 나가면서까지 학문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6년 정도의 포스닥 연구생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차이는 깨닫기는 하였으나, 두 분야의 많은 portion은 교집합을 이룬다고 나는 정의한다. 그건 즉, 동물세포공학 연구실에서의 어깨 너머로 듣고 본 것과 토요일 랩세미나로 축적된 지식들로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technically 어렵진 않았다.
미국에 와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20여 년간 사용했던 나의 사고 체계가 나의 supervisor들과 다름과, 그 속에서 나를 적응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 인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적어도 내가 속해 있던 Ahmad “Mo” Khalil교수와 Wilson Wong 교수의 연구실 (co-advisor)은 한 가지 study를 꽤나 오랜 시간동안 깊이 있게 투자하는 연구실이었다. 논문의 publication quality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연구가 research society, community에 가져다주는 benefit을 생각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감명을 준 부분이었다. 포스닥 연구원으로써 짧은 시간동안 좋은 논문을 써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살던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하나? 와 의 갈등의 연속에서 포스닥 과정을 보냈지만 말이다. 빠른 방향보다, 느리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지도해 주셨다.
누군가에겐 6년이라는 포스닥 기간은 짧음, 그 누군가에겐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나에게 있어도 꽤나 긴 시간 이었지만, 그 거친 강물위의 종이배의 여정은 나름 의미 있고, 견딜만했다. 거친 강물에서 삼켜져, 허우적대던 시간들도 있었다. 1년 반이라는 논문 리비젼 과정은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 된 내적 단단함의 경험치는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이 될 것이라 믿는다. Editor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게 연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설득했던 과정은 아마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흔치 않은 경험일 것이다.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형성 된 소중한 공동연구자 들과의 만남, 힘든 상황 속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교수는 연구자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지를 몸소 느끼게 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경험이다. 연구자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한 과정이라 생각하니 지난 6년의 여정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다. 때론 거친 강물을 만나 종이배가 삼켜질지라도,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고 버티다보면, 또 어느새 잔잔한 바다로 인도해줄 것이다.
사진 1. Mo Khalil Lab Retreat 에서 (2022)
강물은 흘러 바다로
이제 포스닥 연구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인 연구자, 교수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교수의 꿈이 있어서 오게 된 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종이배일 뿐이다.
나에게 선택할 여지가 있을 때, 나는 그나마 내가 잘 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길이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또 흘러 바다로 가든지를 막론하고 나는 그냥 잔잔히, 또 혹은 거센 물줄기에 몸을 맡겨 종이배를 흘려보내곤 했다. 이제 강물보다도 더 넓고, 더 거세기도 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더 넓고, 더 깊어 그야말로 목적지가 없지만, 나는 나에게 다가올 기회, 해야 할 역할에 누구보다 충실하게 몸을 맡기려 한다.
마무리하며,
나는 신이 사람에게 서로 다른 탤런트를 주지만, 적어도 꼭 하나는 준다고 생각한다.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탤런트를 주는가 하면, 꿈이 없지만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탤런트도 준다고 생각한다.
목적지가 없는 종이배일지라도, 종이배가 그은 궤적에 의미를 두는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음을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나와 비슷한 이들을 독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종이배의 여정을 응원한다.
 JOIN
JOIN LOGIN
LOGIN
 Latest update
Latest update